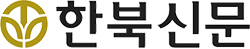홍정덕 논설주간·양주역사문화대학 교수

문제는 그 음식을 따라 배우는 중화요리, 서양요리의 전문요리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김수미의 레시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의 레시피에는 정량(定量)이라는 것이 없다. “마늘 듬뿍, 참기름 두 바퀴”, “식초 는둥 만둥”, “고추가루 살짝”하는 식이다. 바로 <엄마의 부엌>이다.
지금은 사라진 풍습이 되었지만 설이 되면 동네 모든 집에 세배(歲拜)를 하려 다녔다.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면 덕담(德談) 한마디 내려주시고 약소한 세뱃돈을 챙겨주신다. 그 사이 친구어머니는 간소한 세찬상을 준비해 주셨다. 떡만둣국과 전, 나물로 차려진 그 밥상을 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며 먹고 또 먹었었다.
지금도 명확히 기억나는 건 거의 통일되듯 같은 메뉴였던 그 설음식 맛이 모두 다 달랐다는 것이다. 우리네 부엌의 특징이 소금, 된장, 고추장, 간장 이외에 다른 양념 소스가 없는 상황에서 왜 같은 음식의 맛이 모두 달랐던 것일까? 바로 조리의 <정량(定量)>이 없이 주부 자신의 경험과 식구들의 입맛에 맞춘 각각의 <간맞춤>때문이었다. 김치도, 찌개도, 그 때는 집집마다 고유의 맛이 있었다.
예컨대 우리 어머니는 달걀찜에 반드시 곤쟁이젓으로 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황해도식 우리 어머니 달걀찜에서는 상당히 곤역스런 냄새가 났었고 시장에서 빈대떡을 구워 파시던 내 친구 윤선이 어머니는 꼭 돼지비계로 기름을 내어 빈대떡을 구워내셔서 그 고소한 맛에 시장의 장꾼들이 가게로 모여들고는 했었다.
심지어 의정부 시장 안의 떡전에서 인절미를 사면 내주던 멀건 국 사발에도 나름대로 각각 다른 맛이 따로 있었다.
전통적인 손맛으로 담그게 되니 집집마다 빚어내는 술의 맛이 달랐고, 묵혀내는 장맛도, 쪄내는 시루떡도 그 맛이 각각이었고, 바로 그 다양한 손맛이 우리 음식문화의 기본이었다.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동일한 조미료를 정량의 레시피로 만드는 우리 음식은 그 고유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 식재료를 전문으로 파는 큰 상점에 가면 규격화된 장류와 김치는 물론이고 사다가 끓이기만 하면 되는 설렁탕, 추어탕, 육개장을 큰 양으로 팔고 있고 온갖 음식들이 간편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 정체불명의 통일되고 균일해진 한 가지 맛에 길들여지는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가?
“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롭니다!”라는 표현도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