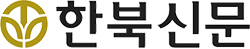서양의 근대정신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oto ergo sum)”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신의 피조물이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주체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물론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한 것은 ‘방법적 의심’을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원리로서의 기하학적 공리(公理)같은 것을 천명하기 위함이었다.
근대정신을 잘 대표하는 이 말은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이 세상에는 홀로 고립된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나’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애써 이러한 고독한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추상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언제나 주변 세계의 타자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두 소년이 굴뚝청소를 하고 나왔다. 한 소년은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나왔고, 다른 한 소년은 전혀 검댕을 묻히고 나오지 않았다.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
이 이야기의 정답은 얼굴에 아무것도 묻히고 나오지 않는 아이이다. 얼굴에 뭔가 묻히고 나오는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친구를 보고, 세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반대로 얼굴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는 소년은 검댕을 묻히고 나온 상대방을 보고 세수하러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타자를 보고 타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파악한다.
백화점에 가서 자신이 물건을 고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물건을 고르는 개인은 언제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행과 타자의 시선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타자의 욕망을 내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나는 언제나 타자와 관계 속에서의 ‘나’인 것이다.
데카르트의 일인칭 단수로서의 인간이해와 달리 한국이나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인간이해는 처음부터 일인칭 복수로서의 ‘우리’인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정체성의 단위는 자주 ‘나’보다는 ‘우리’인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우리말에는 이러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우리 학교’ 등등. 서양인의 경우 ‘나’가 들어갈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통에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에 빠진다.
가족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바로 이러한 현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에는 서양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 IMF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이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의 자발적 봉사 등등은 ‘나’ 를 중심으로 하는 데카르트의 후예들이 흉내 내기 힘든 일들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타인과의 공감(Sympathy)와 연대(Solidarity)가 없으면 곧바로 무너진다. 공자나 맹자가 줄기차게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자아’이다. 이러한 관계는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거나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익명의 ‘나’가 아니고, ‘나’를 ‘우리’에 편입시켜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나’ 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나’는 도덕적으로 관계하기에 비로소 존재하는 ‘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 사이(人間)에서의 사람의 도덕(人倫)전통을 살려 나가야 한다. 세월호와 판교 환풍구에서 일어난 슬픔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자아’ 곧 ‘우리’ 정체성 회복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