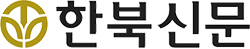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 생태문제까지 나아가기는커녕 아무 대안도 없이 논의에 진전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여전히 인간사회에 국한된 근대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한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이 특별한 선의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분배적, 절차적, 응보적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은 적어도 해당 사회의 안녕과 더 가치 있는 다음 행보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정의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 간 권력과 의무, 기회와 재화, 이익과 부담, 지위와 특권 등 여러 사회적·경제적 가치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즉 평등한 조건에서 분배되는가, 무엇을 평등한 조건·기회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이 전제는 규율이나 권력과 맞닿아 있고 이는 근대 자유주의 이후 기득권의 일방적 입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이익과 맞물려 사회 공공에 대한 의무와 균형을 맞추지 못한, 인격을 잃은 권리 주장(예링 2007)만이 현대에는 효율과 합리라는 허울로 교묘하게 진화해 보편화되어 남은 듯하다.
민주시민의식의 정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는 ‘촛불 혁명’까지 이끌어낸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 생활은 과연 정의로운지 자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는 함께 살아갈 만한 사회인가, 우리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생활을 공유할 만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시민적 재화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른다(샌델 2012).
최근 경기도에서 코로나 19 환자 이송을 위해 이국종 교수와 닥터헬기가 언급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기남부 권역별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하고 잠적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서 놀랐다. ‘나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사투를 벌이며 함께 해줄 것을 믿으며’, ‘조금만, 조금만’을 주문하면서 매달려 있었을 뿐이라 고백하던 그다. 매일매일 우리 주위에서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던 그였다.
외상센터를 찾는 절박한 환자들,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사회통합 안전망 시스템. 이 역시 이국종 교수는 ‘정의’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에 찬 그의 한탄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주의 부재를 재확인한다. 사회에서 제 목소리가 가장 작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 적어도 우리 역시 언제든지 세월호에 탈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매번 망각하곤 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지역에 집중돼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하고,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격리 병원으로 각 의료원을 언급하면서도 공공의료원의 적자운영을 질책하고 효율적 운영 등을 운운해 평가했던 과거에 침묵했던 우리를 알아채지 못한다. 최소 수혜자가 우리의 공공선과 다름에도 아랑곳 않고 한시적으로 우리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공익 병원의 효용성을 말하며 우리 정부를 찾고 또 탓한다.
나는 내 이웃을 목적으로 대하고 내 생활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가? 내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시민적 재화가, 가치의 기준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