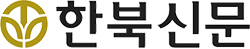시대를 풍미하였으나 이제는 고인이 된 유명했던 한 여배우가 학창시절 너무 가난하여 늘 ‘수제비’를 먹었다고 하여 그 여배우의 애칭 중의 하나가 ‘수제비’였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86년 아세안 게임에서 여자육상 전 분야를 석권하여 국민영웅이 된 한 여성 선수가 역시 너무 가난하여 ‘라면’을 많이 먹었다고 하여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기도 하였다.
밀가루가 지금처럼 한국의 서민음식 재료로 정착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한반도에서 밀은 대단히 귀한 식재료였다. ‘밀가루’를 ‘진가루(眞末)’라고 부를 정도였다. 왜 이렇게 밀가루가 귀했을까?
첫째는 밀을 많이 심지 않았다. 밀을 많이 심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그 하나는 밀이 그리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가을 벼 수확 후 파종하는 맥류의 주종은 식량으로 보다 중요한 ‘보리’가 주종이었다. 봄 절량기에 식용하기에는 밀보다 보리가 훨씬 긴요했기 때문이다. 보리를 ‘대맥(大麥)’이라 부르고 밀을 ‘소맥(小麥)’이라 낮추어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둘째는 ‘밀’의 용도가 따로 있었다. 종가를 위시한 가문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봉사(奉祀)’와 ‘접빈객’이었는데 각각 ‘조상’과 ‘손님’을 대접하는 이 두 행사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술’이었고 이를 위하여 가정 마다 빚어 만들던 ‘가양주’의 핵심재료는 밀로 만들던 ‘누룩’이었다. 즉 집집마다 적게라도 심어 거둔 밀은 주로 술을 빚는 ‘누룩’제조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밀은 재배 면적도 작았고 그나마 생산된 밀은 모두 용처가 따로 있었기에 이를 빻아 ‘밀가루’로 만들어 먹는 일은 아주 드믄 경우에 속했다. 자연히 ‘밀가루’도 귀하고 비쌀 수밖에 없었다.
밀가루가 우리의 식재료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일제 강점기 무렵이었다.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반출해 간 일제는 그 대신 밀가루를 식재료로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1919년 5월에 지금의 북한 진남포에 일본인이 제분공장을 설립하였고 1921년 11월 서울 용산에도 일본인이 풍국제분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당시의 상황을 1934년에 출간된 가다 나오지(賀田直治)가 쓴 <조선공업조사기본개요>에서는 당시 조선의 “밀가루의 수요는 연간 8000만 근, 200만 포대 정도가 되지만, 조선에서 생산하는 양이 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일본에서 6000만 근을 들여 온다”라고 되어 있다.(주영하 <한국의 생활사>)
그러나 본격적인 밀가루의 소비는 1950년 한국전쟁에 미국이 한국에 대량으로 제공한 ‘잉여 농산물’ 밀가루로부터 시작되었다. 가가호호 무상 배급되거나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밀가루가 간편한 ‘수제비’, ‘칼국수’, ‘찐빵’, ‘잔치국수’로 가공되며 비로소 우리 식탁의 주요 식재료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암담하던 시기를 넘기게 해준 고맙고도 슬픈 식재료였다.